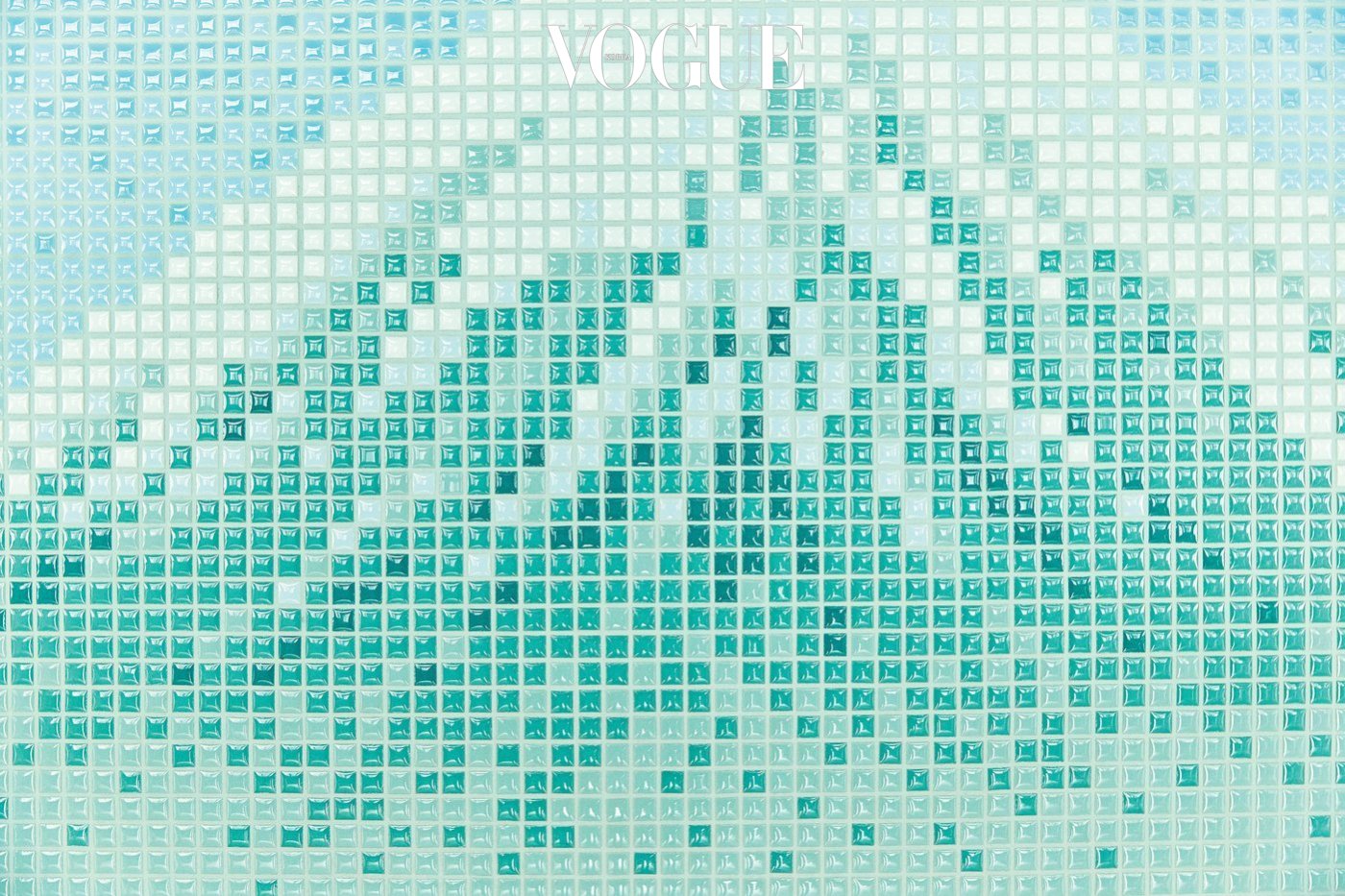동경
벚꽃, 분홍, 마드모아젤, 다다미, 코사지, 보석, 그리고 드레스
도쿄는 우리에게 익숙하다. 2시간 남짓이면 마주하는 이국의 풍경은 새로운 듯하면서도 친숙하다. 하지만 <보그>의 파인더에 담긴 도쿄의 풍경은 다소 생소할지 모른다. 우선 잘나가는 매장으로 즐비한 다이칸야마, 휘황찬란한 밤을 자랑하는 신주쿠, 데이트하기 좋은 오다이바, 전통 사찰이 있는 아사쿠사는 아니다. 우리는 널리 알려진 관광용 명소의 이미지를 탐닉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대신 시계태엽을 감아 과거의 도쿄로 향하기로 했다.
그 첫 목적지는 일본의 대중목욕탕 ‘센토(Sento)’였다. 8세기 나라 시대부터 존재했던 일본의 대중목욕탕은 1900년대 중반 그 인기가 정점에 다다랐고, 집집마다 개인 목욕탕이 생기면서 점차 그 수가 줄어들었다. “요즘 일본 젊은이들은 센토를 즐겨 찾지 않습니다. 보통 지역 주민들이 오랜 주 고객이죠.” 함께 센토를 방문한 일본인 프로듀서가 말했다. 일반 목욕탕과 확연히 다른 건 불교 사찰을 닮은 입구를 비롯한 센토의 건축양식이다. 뜨거운 물을 뜻하는 ‘탕(湯)’이 적힌 일본식 천 커튼(노렌)을 머리 뒤로 젖히고 들어가면, 우선 나무로 된 신발 보관함이 보인다. 남녀 탕의 입구가 흥미롭다. 한국처럼 입구가 다르긴 하지만 아예 벽으로 막히진 않았고 그 중간을 높이 솟은 나무로 만든 계산대(반다이, Bandai)가 지키고 있다. 주인은 이곳에 올라앉아 양쪽 손님들에게 요금을 받는다. 주기적으로 남녀 탕을 바꾼다는 것도 인상적이다. 무엇보다 센토를 둘러보니 지극히 일상적인 일본을 배경으로 한 오즈 야스지로 감독의 영화 속에 들어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보그>가 방문한 이나리유(Inari-yu)는 도심과 떨어진 이타바시역 근처의 목욕탕. 88년 전 지어진 목조건물로 현재 6대째 이어지는 곳이다. 이곳엔 모든 것이 옛날 그대로다. 열쇠 대신 번호를 쓴 나무판으로 사물함을 열고 닫으며, 스모 토너먼트 포스터와 종이 일력이 벽에 걸려 있고, 투박한 아날로그 체중계, 나무로 만든 세숫대야를 사용한다. 탈의실 한쪽에는 아기자기한 정원과 잉어가 있는 연못이 꾸며져 있다. 이곳에선 목욕 중간에 병에 든 우유를 마시며 흡연도 가능하다. 센토의 백미는 탕 안에 그려진 후지산이다. 목욕탕마다 개성 넘치는 풍경이 자리한다. 도쿄에 몇 남지 않은 목욕탕 벽화 장인 중 한 사람인 마루야마 기요토의 후지산 그림이 이나리유 안에서 그 위용을 뽐낸다. 입장료 500엔이면 이 모든 세월의 산물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셈이다. 도쿄 내에는 수백 개의 센토가 있으니 색다른 여행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나절쯤 시간을 보내도 좋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아라카와강 근교다. <보그> 팀은 니시카사이의 명물인 아라카와강 주변 2층 식당을 찾았다. 도쿄 중심에 있는 나카메구로 지역의 메구로강 주변 벚꽃도 유명하지만, 이곳에서는 좀더 한적하게 벚꽃을 구경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에 자주 등장하는 이곳에선 한적하게 공원을 산책하기도, 여름철 불꽃놀이(하나비)를 감상하기도 좋다.
도쿄역에서 스미다강을 넘어 30분을 달려야 도착하는 이곳에서는 마주하는 풍경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가득하다. “도쿄에서 이런 동네는 처음이에요. 평생 살고 싶을 정도예요.” 일본을 수없이 오간 포토그래퍼도 니시카사이 동네가 주는 한적함에 매료됐다. 니시카사이의 명물은 뭐니 뭐니 해도 디즈니랜드에 가기 전에 보이는 가사이임해공원이다. 1989년 개원한 이 도립공원은 만화 <허니와 클로버>에도 배경으로 등장한 바 있다. 아는 사람들만 찾는다는 이곳에선 117m에 달하는 도쿄 최대 대관람차, 수족관, 조류원을 구경할 수 있다. 그중 사방이 유리로 뻥 뚫린 전망대는 일본의 유명 건축가 다니구치 요시오의 작품이다.
드넓은 도쿄만이 한눈에 보이는 명소. “먼 훗날 돌이켜보고픈 청춘의 한 컷. 젊음의 하이라이트를 듬뿍 담아 찍겠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거닐며 <허니와 클로버>의 대사처럼 눈에 보이는 풍광을 마음속에 담았다. 지금 이 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니까.


칼 라거펠트는 2018 S/S 오뜨 꾸뛰르 컬렉션을 프랑스적인 정원을 배경으로 선보였다. 모델들은 검은색 베일을 쓰고 장미, 아이비, 재스민으로 덮인 아치 밑을 걸어 나왔다. 큼지막한 꽃 장식 헤드피스와 염색한 꽃잎 하나하나를 수놓은 분홍색 드레스가 근사한 하모니를 이룬다.

꾸뛰르 컬렉션은 샤넬 공방의 협업으로 탄생한다. 몽테(Montex) 공방의 비즈 장식 톱에 발레리나가 연상되는 풍성한 튤 스커트를 연결한 드레스에 투명 굽 부츠를 매치했다.

이번 컬렉션을 아우르는 컬러인 핑크를 다채롭게 변주했다. 파스텔 톤 핑크 드레스의 깃털 장식은 르마리에(Lemarié) 공방의 솜씨.

마드모아젤 샤넬이 좋아하던 밀리터리 재킷을 좀더 현대적으로 해석했다. 넓은 어깨에 기모노 슬리브 형태를 더한 트위드 원피스가 바로 그것. 다양한 핑크 컬러 코사지 장식이 돋보이는 검정 망사 헤드피스는 메종 미셸(Maison Michel)의 솜씨다.

잔잔한 꽃무늬를 프린트한 오프 숄더 드레스에 빨간색 꽃 헤드피스를 연출했다.

“오뜨 꾸뛰르의 옷은 지독히도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를 바로 알아챌 수 있죠.” 칼 라거펠트의 말을 떠올리게 하는 정교한 레이스와 풍성한 튤을 겹겹이 장식한 블랙 드레스.

보석 장식 버튼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튤 드레스와 볼레로, 여기에 신발 공방 마사로(Massaro)의 검은색 페이턴트 레더 앵클 부츠를 매치했다.

흰색 꽃을 자수로 새기고 아랫단을 깃털로 장식한 오간자 튜닉을 레이어드한 뷔스티에 드레스, 거기에 보석 장식 부츠로 섬세한 아름다움을 연출했다.

화려한 메탈릭 레이스가 인상적인 점프수트. 촉촉이 내리는 봄비처럼 영롱하게 반짝인다.

칼 라거펠트는 같은 색 핑크라도, 골드, 네온, 그린 실을 섞어 풍성한 색감을 만들어냈다. 오묘한 빛을 발하는 이 핑크색 재킷과 스커트처럼.

흰색과 은색 실이 섞인 트위드 원피스는 밑단과 소맷단을 깃털로 장식했다. 비즈 장식으로 정교한 멋을 뽐내는 부츠 또한 이번 컬렉션의 키 아이템.

기모노 여인이 들고 있는 드레스의 튤 장식은 공방 로뇽(Lognon)의 작품. 화보에 나온 모든 의상과 액세서리는 샤넬 오뜨 꾸뛰르(Chanel Haute Co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