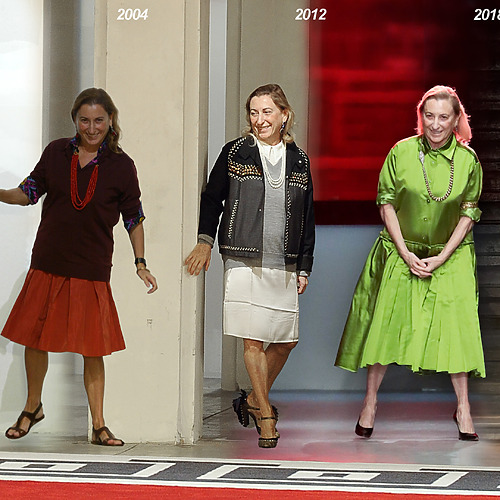당신의 지도에는 없는 나라
요즘 나의 국적은 ‘중고나라’다. 시간은 남아돌고 돈은 한 푼이 아쉬워서, 라고 짐작하면 섭 섭하다. 다른 이유가 더 있다.

몇 해 전 겨울, 큰맘 먹고 150만원짜리 캐나다구스 패딩을 샀다. 묵직하기가 이순신 장군 갑옷 같은 옷이다. 더 이상 추위에 지지 않겠다, 코트 따위 개나 줘버려, 라는 선언이었다. 그런데 동남아 3성 호텔 석 달 숙박료가 150만원이라는 걸 알고부터, 나는 추위와 싸우지 않기로했다. 겨울옷을 살 돈으로 겨울마다 여행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엔 겨울 여행과 전세 계약 만료가 겹쳤다. 짐을 비키니장 두 개에 담아 언니에게 맡기기로 했다. 그 비키니장에는 F/W 의류뿐 아니라 다녀와서 쓸가재도구 일체가 들어갈 예정이다. 그래서 나는 동남아에 가기 전, <보그> 독자들의 지도에는 없을 가능성이 큰 어느 멋진 나라를 경유하기로 했다. 현재 그곳의 인구는 1,593만여 명으로, 잠비아 전체 인구보다 4만 명 적고 과테말라보다는 47만 명 많다. 이름하여 ‘중고나라.’ 변덕쟁이 수집가와 얼리어댑터, 알뜰한 서민 그리고 사기꾼들이 ‘어울렁 더울렁’ 살아가는 아주 역동적인 나라다.
친구들은 놀란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다고? 직거래? 위험하지 않아?” 물론 위험하다. 조각난 고지서를 이어 붙여 명의를 도용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남의 노후 자금을 뺏는 놈들이 판치는 세상이니까. 인터넷에도 딱 그 정도 위험이 도사린다. 그래서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한다. 인기 좋은 아이템을 터무니없이 싸게 내놓고 택배로 거래하자는 건 십중팔구 사기다. 물론 진짜 물욕 없는 천사(A.K.A. 호구)도 더러 있다. 삼대가 복을 쌓으면 만날 수 있다는 중고나라의 호… 아니 절약 요정, 그게 바로 나다.
나의 중고 거래 역사는 15년 전으로 거슬러간다. 꼭 사고 싶은 이어폰이 있는데 단종되어 구할 수가 없었다. 인터넷 음향 사이트에서 중고 매물을 찾았다. 판매자는 회사 앞까지 찾아오는 호의를 베풀었다. 하지만 아직 상도덕을 깨치지 못한 나는 물건이 마음에 안든다며 그를 돌려보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여자분이 나오실 줄은… 사실 제가 신림동에서 경찰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분과 대화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만으로도 나온 보람이 있습니다.” 그는 쩔쩔매면서 이런 말을 했다. 지금은 훌륭한 민중의 지팡이가 되셨겠지요?
호기심 많고 싫증 잘 내고 쓸모 다한 물건을 못 봐주는 나는 그후로도 자주 중고 거래를 했다. 컴퓨터, 오디오, 카메라, 피규어, 만화책 등 기종이나 제목만 들으면 알 만한 것들 위주다. 품목이 그러니 “여자분이 나오실 줄은…”이란 말은 이제 익숙하다. 언젠가 BMW를 몰고 오디오를 사러 온 남자는 나를 보자마자 부끄러운 짓을 하다 걸린 어린애처럼 당황했다. ‘저 여자가 나를 할 일 없는 지질이로 보면 어쩌지?’ 걱정하는 눈치였다. 에이, 동포끼리 왜 그래요.
나는 때로 돈을 떠나 오로지 자원 순환을 위해 버릴 물건에게 새 주인을 찾아준다. 얼마 전엔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카드 리더기며 USB 허브, 외장 CD롬 등 신석기시대의 유물을 왕창 발굴했다. 카드 리더기를 보낸 주소는 어딘가의 고시원이었다. 가격은 택포 5,000원. 구매자는 안타까움 가득한 문자를 보내왔다. “택배비가 4,000원이나 나왔네요. 편의점 택배가 우체국보다 쌉니다.” 그는 내가 꼴랑 1,000원 남겨먹으려고 이 짓을 했다 생각하고 충고를 한 것이다. 1,000원이면 잡지 원고 13글자(공백 포함) 값이다. 귀한 돈이긴 하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라고 답을 보냈다. 사실 나는 나와 접점이 없는 사람들과의 이런 짧은 커뮤니케이션을 수집하는 것이 흥미롭다.
최근엔 ‘비키니 프로젝트’ 때문에 패션 아이템으로 영역을 넓혔다. 옷을 처음 팔아보는 나는 의욕에 차서 20종이 넘는 아이템을 정성껏 촬영하고 코멘트를 썼다. 토끼털 코트를 산 구매자는 “글을 너무 믿음이 가게 잘 쓰셨어요”라고 칭찬을 해주었다. “그게 직업입니다. 이 빌어먹을 필력은 숨길 수가 없군요. 핫핫핫.” 자랑을 쓰다가 지웠다. 아무튼 패션 아이템의 문제는 품목이 너무 다양해서 중고 가격을 책정하기 어렵다는거다. 그나마 버버리 트렌치는 검색하니 8만~9만원대 매물이 쏟아졌다. 아무래도 그건 좀 아까워서 10만원에 물건을 올려봤다. 5분 만에 연락이 왔다. “저… 가격이 너무 싸서 걱정이 되는데 혹시 가품인가요?” “아니요, 뉴욕 아울렛에서 산 메이드 인 잉글랜드 정품입니다.” “착용 샷 좀…” 오밤중에 잠옷 위에 트렌치를 걸치고 정면, 측면 꼼꼼하게 사진을 찍어 보냈다. 매물 노출에서 입금까지 딱 15분 걸렸다. 나보다 구매자가 더 다급한 눈치였다. 얘기를 전해 들은 친구들은통탄과 절규를 쏟아냈다. 알고 보니 내가 본 시세는 정말로 가품 가격이었다. “나한테 팔지!” “물러와!” “새로사려면 200만원이야!” “이 바보 멍청아!” 하지만 연휴라 택배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하자 “힘들게 돌아다니지 마세요. 잊지만 않으시면 돼요^^”라고 공손하게 답을 보내는 그녀에게 차마 “내가 착각했으니 무릅시다” 할 수는 없었다. 마침 주소가 여대 근처기에, 버버리트렌치를 너무 갖고 싶던 사회 초년생이 얼결에 관대한 언니를 만나 횡재했다 상상하며 축복을 빌기로 했다. 그 코트를 사던 10년 전의 설렘이 떠올랐다.
해외 구매 대행까지 해가며 어렵게 구한 마르지엘라 드레스를 3만원에 사간 어느 여성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훈훈해진다. “제가 아기 낳고 살이 쪄서… 배가 많이 낄까요?” “괜찮을 겁니다.” “혹시 조금 네고는 안 되나요?” 그런 대화가 오갔다. 밤 11시였다. 나는 정색하고 답을 보냈다. “너무 싸게 올린 게 후회돼서 오늘 안 팔리면 가격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답이 왔다. “아, 죄송합니다ㅠㅠ 3만원에 살게요. 그런데 입금은 내일 해도 될까요? 남편이 자질 않네요ㅠㅠ.” 나는 또 상상한다. 출산으로 몸매가 변하고 육아때문에 바빠서 쇼핑이 스트레스일 때, 남편 눈치 보고 판매자 면박받으며 꿋꿋이 구입한 드레스가 마음에 쏙 들어 행복해진 여성의 표정을. “물건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에서 나는 그것을 보았다. 내가 한때 사랑했고, 여전히 가치 있지만 내게는 필요 없어진 물건이 다른 누군가에게 행운의 선물이 되어 다시 사랑받는 것, 그거야말로 내가 중고 거래를 좋아하는 결정적 이유다.
나의 비키니 프로젝트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이번 주에는 겨울옷이 없다고 덜덜 떨며 집에 온 친구 커플에게 패딩 점퍼를 하나씩 입혀 보내고, 아름다운가게에 의류 100여 점과 소형 가전을 기증하고, 다 읽은 책은 알라딘 중고서점에, 애지중지하던 기타는 낙원상가에 팔고, 극세사 이불은 동물보호소에 보냈다. 버리는게 목적이면 고물상을 불러 한 방에 보내는 게 간편하다. 하지만 나는 나의 물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 모든 물건에는 그것을 설계하고 만든 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 쉽게 내칠 수가 없다. 나는 지금 오랜 친구들과 공들여서 긴 이별을 하고 있다.
- 에디터
- 조소현
- 글쓴이
- 이숙명 (칼럼니스트)
- 일러스트레이터
- 조성흠
추천기사
-

아트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주목받은 신간 4
2024.07.03by 이정미
-

여행
여름 향기 품은 꽃 축제 3
2024.06.28by 이정미
-

리빙
아름다운 운하를 품은 집! 레이던에 자리한 마리아의 근사한 홈 #마이월드
2024.06.20by 소지현
-

여행
니고의 감각이 녹아든 'Not a Hotel Tokyo'
2024.07.25by 오기쁨
-

여행
올드 머니 룩의 아이콘, 소피아 리치의 여름휴가 패킹 가이드
2024.07.07by 황혜원, Riann Phillip
-

뷰티 트렌드
사랑스러운 단발! 나나의 파격적인 변신
2024.07.16by 오기쁨
인기기사
PEOPLE NOW
지금, 보그가 주목하는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