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야
호칭은 서열을 드러내는 계급장이자 예민한 세상의 방어기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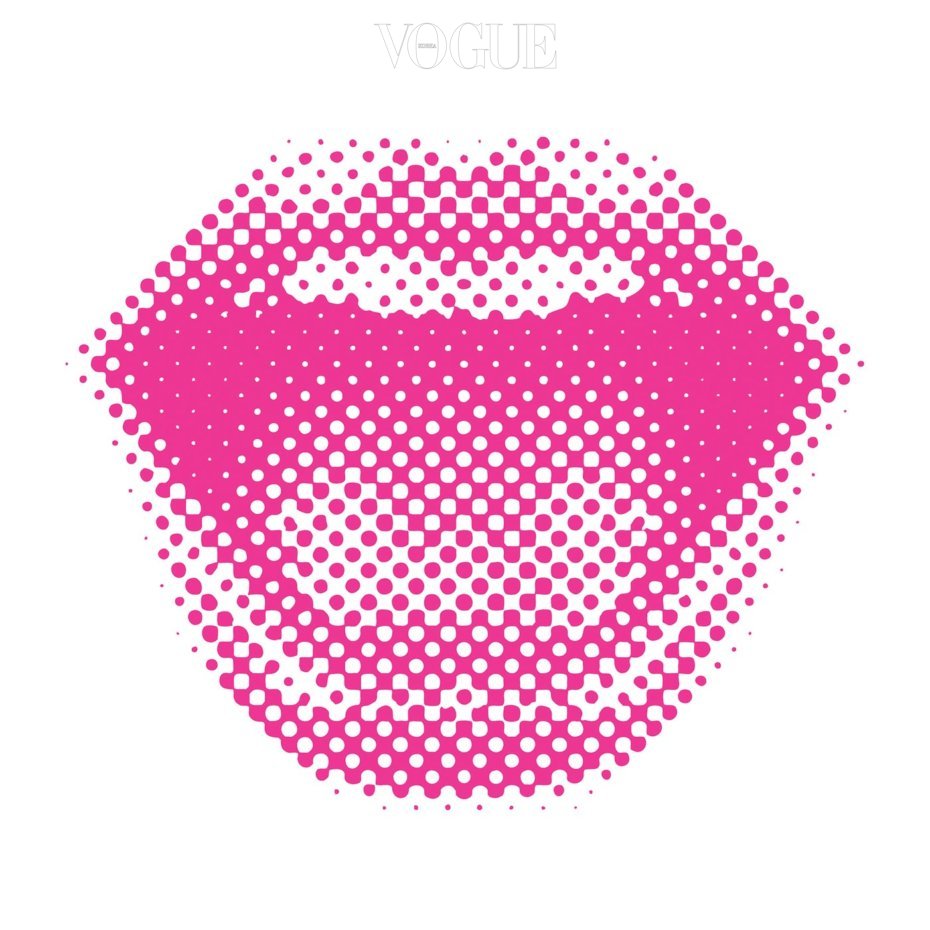
__________________________<SKY캐슬>에서 염정아의 “아갈머리”보다 귀에 덜그럭대는 대사는 “자기야”였다. 곽미향(염정아)은 진진희(오나라)를 ‘자기야’라 부른다. 진희 씨 혹은 수한 엄마도 있는데. ‘자기’는 부부 관계에서 ‘여보’ 다음으로 많이 쓰는 호칭이다.(국립국어원 2017년 설문 조사) 드라마에선 곽미향이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서열은 정리하고 친근함도 보여주려 선택한 호칭이다. 나도 일하면서 ‘자기야’를 종종 듣는다. 이런 상황이다. 경력이나 나이가 나보다 한참 위지만 협업하는 동등한 관계일 경우, 그 연장자는 나를 ‘기자님’이라 부르기엔 입이 떨어지지 않고, ‘나랑 씨’라기엔 내가 기분 나빠할 거 같은지, 호칭을 빼거나 ‘자기야’를 쓴다. 자신의 입지는 살리면서 ‘갑분싸’를 예방하는 호칭인 셈이다(다행히 나는 업계 관계자에게 만사 통용되는 ‘실장님’이란 호칭이 있다).
호칭은 계급장이다. 차라리 나이로 나뉘는 호칭이 순수하다. 돈이 많건 적건, 지위가 높건 낮건 모두 한 살씩 먹으니까. 이제는 계급, 서열에 따른 호칭이 나이를 앞서곤 한다. 겉으로는 계급 없는 민주 사회지만 현실에서는 은밀하게 정해지는 서열과 갑질 문화 때문에 호칭은 다변화되고 있다.호칭 중에도 많이 쓰지만 의미가 변하고 상황에 따라 뉘앙스가 달라져 화자와 청자를 애매하게 만드는 어벤저스가 있다. 씨, 님, 선생님, 여사님.
세력을 잃어가는 호칭은 씨다. 씨는 ‘이름에 붙어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이르는 말’이지만, 존칭보다 수평적 관계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하대한다는 누명도 받는다. 예를 들어 내가 편집장님께 ‘신광호 씨’라고 부른다면… 상상하지 않겠다. 회사가 아니라 사석에서 고등학생이 나를 “나랑 씨”라고 부른 적 있다. ‘뭐 이런 자유로운 영혼이’라며 기분 나빴다. 씨는 존칭인 데다 공석이 아닌 사석인데 말이다(내가 꼰대다). 씨의 위치가 변하긴 했다. <한겨레>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보도하며 ‘김정숙 씨’라고 표기해 독자 항의를 받았다. 신문사는 “‘씨’는 사전적 의미와 달리 점차 존칭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추세”임을 인정한다며 여사로 정정했다.
‘씨’의 자리는 점차 ‘님’이 차지하고 있다. 요즘 공공 기관, 카페, 학원, 병원 등 불특정 타인과 교류하는 공간에선 00 씨가 아니라 00 님이라 부른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쓸 때나 ‘씨’라 붙일 정도다. ‘님’은 1990년대 초반 컴퓨터 통신이 싹트던 시절, 네티즌끼리 예의는 지키되 복잡한 호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용한 호칭으로 오프라인에도 퍼졌다. “커피 님 나오셨습니다”는 사라졌지만 인간에게는 더욱 님으로 존대한다. 극존칭이 느는 이유는 다들 예민하기 때문이다. ‘님’에서 존중의 뜻보다는 어떤 꼬투리도 잡히지 않겠다, 건드리지 않겠다, 피해 보고 싶지 않다는 기저가 느껴지곤 한다. 나랑 씨는 기분 나쁘고, 나랑 님은 괜찮은 사람이 많으니까. 기대하는 호칭과 현실이 다를 때 지위가 도전받는다고 느끼는 이들이 늘고 있다.
‘선생님’도 그 덕에 부상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시민을 만나면, 거의 100% “선생님”이라 부른다. 뭐 하나 꼬투리 잡히고 싶지 않은 연예인의 가시방석이 빚어낸 선생님 풍년이다. 한때 일을 함께한 MBC J PD는 늘 나를 “선생님”이라 부른다. 그는 나보다 다섯 살 많다. 왜 그러느냐고 따지자 그는 “에디터님은 영어와 한글 조합이 네 글자라 입에 안 붙고, 나랑 씨는 뭔가 하대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그는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더 선생님을 붙인다고 했다. 그 말에 기분 나빴다. 내가 그러니까, 당신보다 약자라는 거네? 그는 이렇게 변을 했다. “방송국 내에선 선배, 형, 누나 등 살가운 호칭을 쓰지만, 직업 특성상 애매하게 접촉하는 수많은 타인을 부를 호칭이 절실해요. 선생님이 친밀감은 덜해도 상대에게 존중을 표할 호칭이잖아요. 사실, 방어기제로 쓰기도 해요. 자칫 호칭을 잘못 썼다가 상대가 기분 상할 수 있고, 관계가 나빠질 수 있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극존칭을 쓰는 거죠.” 삐끗하면 초토화되는 예민한 세상에서 선생님은 방어기제다.
여사님도 씁쓸하다. 흔히 식당, 마트 등의 중년 여성노동자에게 여사님이라 부른다. 여사님이 아줌마, 언니, 이모님을 이길지 모른다. 여사님은 상대를 몹시 존중하는 듯 보이나, 특정 직함이 없고 이름을 부르며 관계 맺을 이유가 없는 여성을 겉으로만 치켜세워 부르는 위선이 되곤 한다. 책 <나는 이렇게 불리는 것이 불편합니다>는 영화 <카트>를 예로 든다. 남자 직원, 관리자는 생계를 위협받는 여성 노동자의 농성은 무시하면서도 그들을 ‘여사님’이라 부른다. ‘마음에도 없는 존칭으로 현실의 참혹함을 가리려는 화장술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보그> 아트 디렉터에게 홍 여사님이라 하지 않는다. 그녀는 ‘부장님’ 혹은 ‘팀장님’이라는 뚜렷한 직함이 있기 때문이다.
호칭이 계급을 무너트리려 노력하는 사례도 있다. 대학에선 ‘씨’가 부상 중이다. 선후배, 언니, 오빠 대신 00 씨라 부른다는 기사를 봤다. 학번에 따른 위계질서보다 수평적 관계를 추구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그 분석까진 ‘오바’고요.” 서강대 1학년 K는 “어쨌든 계속 얼굴 보는 같은 과가 아니면 거의 00 씨로 부른다”고 했다. “특정 호칭을 붙이려면 상대의 나이나 학번을 알아야 하고, 대화가 길어지면서 굳이 관계를 맺게되죠. 나보다 나이는 많은데 학번은 아래네, 빠른 년생인데 어쩌지 하는 시뮬레이션도 귀찮아요. 무엇보다 억지로 위아래를 만들고 싶지도 않고요.”
회사에서는 이 수평적 문화를 위해 직함 대신 ‘00 님’을 쓰는 유행이 일었다(도저히 ‘씨’까지는 갈 수 없나보다). 2000년 CJ그룹을 필두로, SK텔레콤, 아모레퍼시픽, 삼성, 넥슨, 엔씨소프트 등 많은 기업이 참여했다. 어느 곳은 영어 이름을 부른다. 토니가 종종 토니 부장님이 돼서 문제지만. 콘텐츠 제작사 사다리필름은 영어와 별명을 합쳐 부른다. 문단열 대표는 댄디(대니얼+대디), 공동 창업자인 안효리 PD는 횰티(효리+아티스트)다. 댄디는 연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아무나 다 사장님, 회장님, 부장님, 팀장님… 벼슬을 못해 죽은 귀신이 붙은 민족인지. 이름 석 자도 외우기 복잡한데 뒤에다 갖다 붙이는 건 가관이라서.” 호칭은 점점 더 관계(서열)의 표식이 되고 다변화되어 애매하고 찜찜한 상황을 만들어낼 거다. 그래서 나는 어떤 호칭을 선호하느냐고? 서열을 가르지 않고, 존중하면서 평등한 호칭은 어디 없나? 씨, 님, 선생님, 여사님의 본뜻이 그러한데. 힙합 평론가 김봉현이 보낸 카톡 메시지에서 힌트를 얻었다. “존대는 하지만 누굴 만나든 쉽게 호형호제하지 않아요. 진짜 우정은 만나자마자 갈아치우는 호칭으로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방시혁 프로듀서가 몇 년 전 제게 ‘거리감이 유지돼야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무릎을 탁 쳤죠. 저는 관계의 부담을 본능적으로 회피하려 합니다. 상처 받거나 삶의 균형이 깨질 수 있잖아요.”
나는 그에게 답장을 보냈다. “저도 거리감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분간 아무런 호칭도 안 붙이려고요. 누군가를 특정 호칭으로 부르는 순간 너무 많은 것이 규정되어버리잖아요? 아, 그전에 호칭으로 대접받으려는 제 버릇부터 고치고요.”
- 에디터
- 김나랑
- 포토그래퍼
- GETTYIMAGES KOREA
추천기사
-

아트
스페인 '보그'가 해석한 한강의 세계
2024.12.10by 황혜원, Tania López García
-

아트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이중 하나는 거짓말'
2024.12.09by 오기쁨
-

아트
예술계가 사랑한 건축가, 아나벨레 젤도르프의 미술관
2024.12.11by 류가영
-

아트
'프리즈 런던 2024'에서 발견한 미술계의 변화
2024.11.28by 김나랑
-

아트
요람에서 무덤까지, 베니스의 국제 공예 비엔날레 ‘호모 파베르’
2024.11.29by 김나랑
-

아트
힐러리 페시스가 그린 아주 일상적인 그림
2024.11.25by 김나랑
인기기사
지금 인기 있는 뷰티 기사
PEOPLE NOW
지금, 보그가 주목하는 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