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환대하는 용기
종종 영화 비평 수업을 할 때가 있다. 그때마다 영화란 무엇인가, 비평이란 무엇인가, 혹은 조금 다르게, 무엇이 영화가 되고, 무엇이 비평이 되는가를 질문하고 답해보자 한다. 그리고 덧붙인다. 당신이 그렇듯 나도 의심하며 계속 찾고 있다고. 무수한 어렴풋함 속에서 벼락처럼 선연해지는 한순간, 그 한가운데 있는 것 같다고. 이런 평소의 입장이 이끌어준 우연일까. 장희원의 소설집 <우리의 환대>(2022, 문학과지성사)를 만나게 된 것이.

장희원 소설집 <우리의 환대>(2022, 문학과지성사) @moonji_books
“언제나 좋은 글을 쓰고 싶은 바람이 있지만, 생각만큼 그것이 잘 이루어지진 않는다. 아마 영원히 채울 수 없는 목마름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쓰고 있고, 쓰고 싶다.
글을 쓸 때마다 나를 미워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말해주었다. 그 말에 몸과 마음을 기대면서도, 대체 나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 걸까 초조해했다. 그게 뭘까. 내 눈엔 보이지도 않는데. 무엇인지조차 모르겠는데. 하지만 마찬가지로 나도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시 마음껏 그 말에 기대었다.
어쩌면 세상은 그런 알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진 곳일지도 모르겠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조차 모르는 너무나 많은 면이 있고, 당신의 눈에서조차 보이지 않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작은 한 점에 누군가는 자신의 마음을 두고, 살고 싶어진다는 것.”
2019년 단편 <폐차>로 등단한 장희원의 세계를 만나게 된 건 순전히 작가의 말 때문이다. 그 마음을 알 것 같았다. ‘그럼에도 쓰고 있고, 쓰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이기도 했다. 알 수 없는 것들로 이뤄진 세상의 신비를 긍정하고 그에 기대다가도, 이 세계의 비정함에 격분하고 체념하길 거듭해왔으니까.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세상일이라 말하는 쪽보다는 살아갈수록 알 수 없는 것투성이라고 말하는 편에 이끌리고, 그럼에도 세상의 가장자리라도 어떻게든 더듬대고 서성이는 이들의 흔적에 오랫동안 시선이 머무는 건 어쩔 수 없는 기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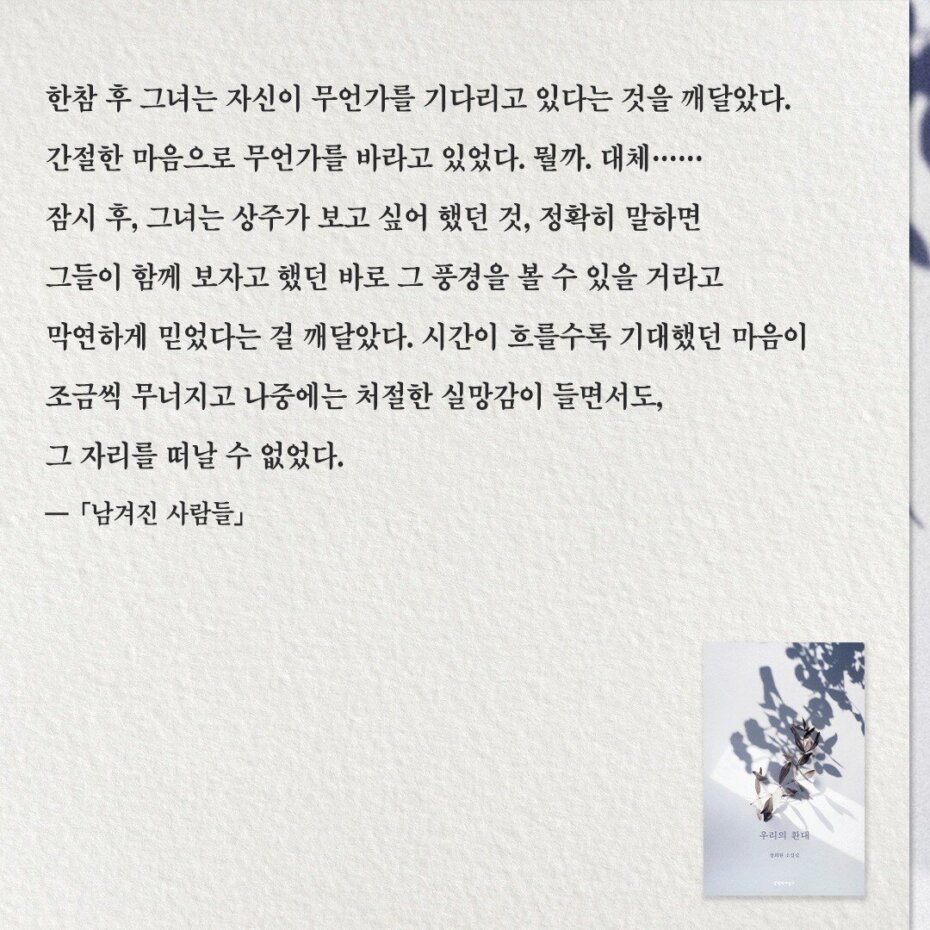
<남겨진 사람들>, @moonji_books
작가의 말에 기대어 들어선 세계는 하나같이 상실과 부재 그 후의 시간이다. 소설 속 사람들은 그 시간 속에서 버티고 서 있다. 죽은 친구 아버지의 초대로 친구 없는 친구 집에 가게 된 두 친구의 마음의 풍경 <폭설이 내리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난 자리에서 이제 더는 함께 볼 풍경이 없다는 사실을 차갑게 체감하는 <남겨진 사람들>, 이별한 커플이 함께 살던 집을 정리하다 갑작스레 출몰한 거미를 보며 ‘우리 모르게 숨어 있는 것들이 모두 나오는 순간’을 기다리는 <우리가 떠난 자리에>처럼 책에 실린 9편의 단편을 잇는 건 죽음, 작별, 떠나감의 감각이다. 하지만 소설의 시선은 상실의 연유를 추적하는 게 아니라 남아 있는 이들, 그럼에도 살아가야 할 이들, 부재한 이를 기억하는 이들로 줄기차게 향해 있다. 그리고 애초부터 호들갑이라는 단어는 알지 못한다는 듯 시종 차분하고 냉정하게, 그만큼 뼈아프게 물어온다. 상실 이후 남아 있는 이들은 같은 마음일 수 있는가. 가족, 친구, 연인이라는 말로 명명되는 관계 속에서 서로는 얼마나 같아질 수 있는가. 어찌하다 모종의 동류의식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건 그것대로 괜찮은 것인가. 표제작 <우리(畜舍)의 환대>만 봐도 아찔하다. 타국에 머무는 아들을 보러 간 부모는 자신들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과 한집에서 너무도 잘 살고 있는 아들을 보며 당혹스럽다. ‘내가 아는 아들이 맞는가, 어쩌면 한 번도 아들을 제대로 안 적이 없었던 건 아닌가.’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뜻하는 일인칭 대명사 ‘우리’와 가축을 키우는 곳인 ‘우리’라는 뜻을 지닌 동음이의어를 통해 한때는 우리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저만치 멀어진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에 기분 나쁜 혐오의 냄새와 촉감마저 덧붙여졌다.
너무 비관적인가. 어쩌면.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이 차가운 직시가 있기에 나와 당신이 잠시나마 함께했음을, 잠깐이지만 우리일 수 있었음을 뒤늦게라도 알 것 같다. 동시에 이 직시야말로 상실 이후를 살아가는 이들이 마주해야만 하는 삶의 몫이라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다. 죽음과 상실만큼 특별한 사건도 없기에 또 다른 사건으로 이 시간을 채우려 들 수 없다는 듯이. 소란스러운 애달픔 하나 없이 떠나간 이가 있었음을, 나와 함께한 당신이 있었음을 응시할 뿐이다. 죽은 가족을 애도하던 <기원과 기도>의 마지막 문장처럼 ‘우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없이 그 풍경을 마주할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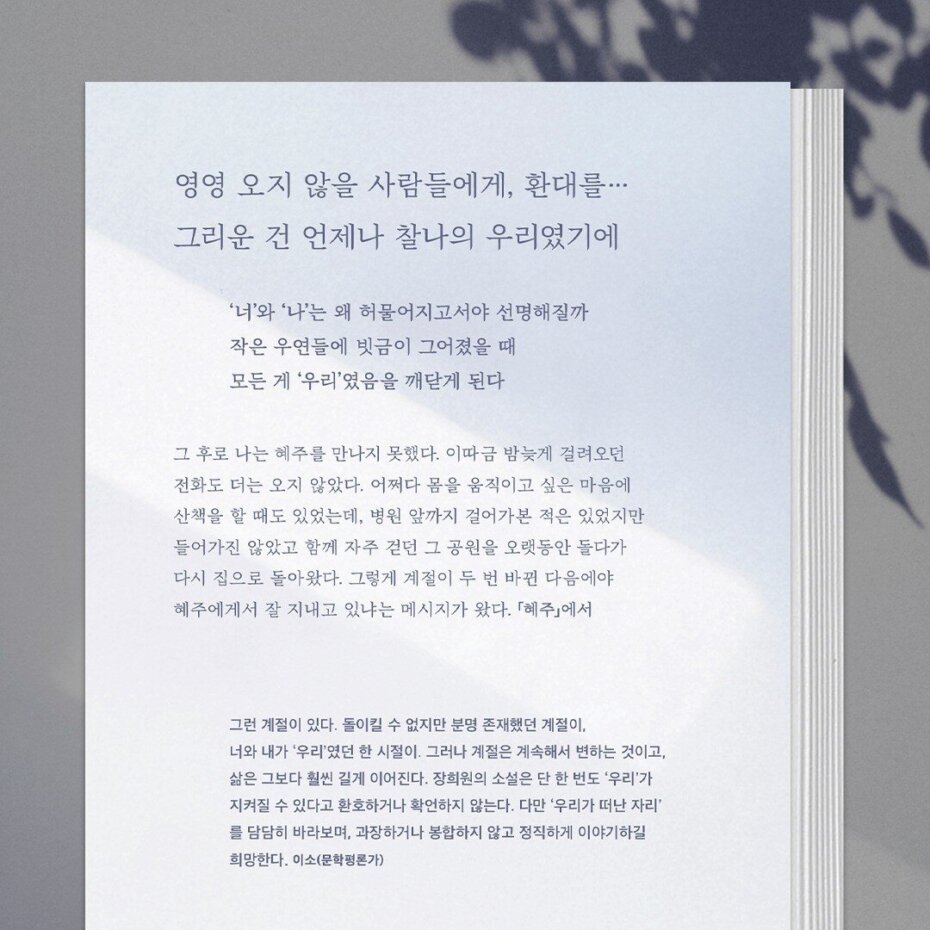
@moonji_books
많은 이들이 떠나간 한 해의 끝에서 더듬대는 문장들이라 그런지 더욱 아리다. 다시 ‘작가의 말’로 돌아가 마지막 문장을 적으면 조금은 나아질까.
“모두 자신에게 기대고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