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et
LGBT 시인들의 사랑시 75편을엮은 〈우리가 키스하게 놔둬요〉가 출간됐다. 사랑이라는 관념을 다시 사유하게 한다. 이들의 문학이 계속 발간되어야하는 이유를 김현 시인이 솔직하게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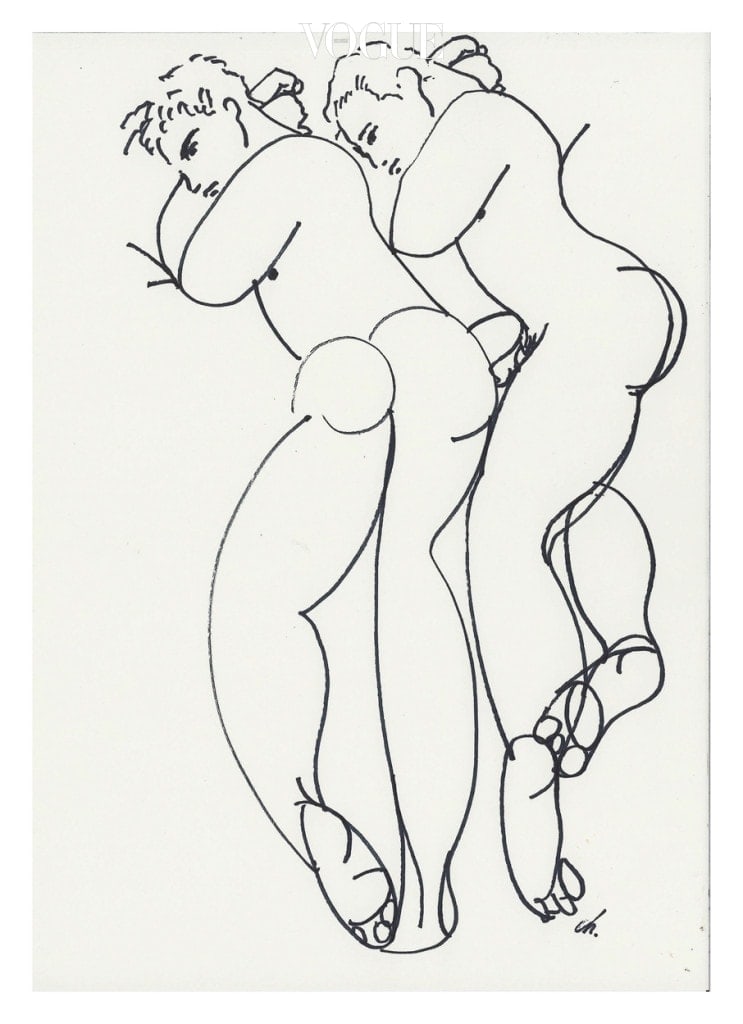
얼마 전 한국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글쓰기 강좌를 진행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소모임인 ‘책읽당’ 사람들이 주축이 된 강좌였다. 책읽당에서는 매해 가을 문집을 발간하는데, 이번에는 좀더 색다른(?) 책을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사전 모임을 준비한 것이라고 했다. 열다섯 명 남짓 되는 수강생들은 매주 본인들이 쓴 글을 들고 왔고, 서로의 글에 관해 꽤 날카로운 감상을 나눴다. 모두 성실했다. 그들은 게이로서 자신들이 누군가와 몸과 마음으로 관계 맺고 사는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들려주었는데,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성소수자의 삶에 관한 것이었다. 왜 아니겠나.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고유한 서사의 덩어리인 것을.
그들 대부분은 성실한 노동자들이었고 성실한 인권 활동가들이었으며 또한 성실하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자 하는 이들이었다. 때때로 욕망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욕망하기도 하고 끝없는 욕망 때문에 인생의 허망함을 일찍 알아차린 20대도 있었다. ‘일반적인’ 것이었다.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이들 편에서 보듯 게이들의 삶이 자나 깨나 항문 섹스를 생각하는 단순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내용이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인상적인 두 사람의 글이 떠오른다.
본인이 HIV 감염인임을 처음으로 공공연히 말했던 날에 관하여 쓴 밝은 글과 젊을 적 자신이 겪었던 폭력 피해 경험을 꽤 자세히 적은 어두운 글이었다. 빛과 어둠. 끝과 시작. 긍정과 부정. 결은 조금 달라도 두 기록은 모두 자신에 관해 말하기, 또 다른 커밍아웃에 관한 글이었고 그것을 타인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글이었다. 무엇보다 두 개의 기록은 그 자체로 생존자로 거듭난, 거듭나는 이의 용기 있는 증언이기도 했다. 나는 지금도 자신이 쓴 글을 꼭 소리 내어 읽어보고 싶다던—자신의 목소리를 스스로 극복하려던—성소수자의 얼굴을 선명히 기억한다. 그것은 지극히 현실에 기반을 둔 얼굴이었지만, 바로 그 때문에 꼭 문학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얼굴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현실은 언제나 시간에 지기 때문이다. 시간을 이기고 살아남는 것은 언제나 문학, 예술뿐이다.
언젠가 아내 폭력 피해 생존자 수기집 출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나는 “한 권의 책은 누구보다 오래 살아남아 한 사람을 구원하기도 한다”는 말을 했다. 마찬가지로 나는 어떤 ‘퀴어의 얼굴’이 누구보다 오래 살아남아 한 사람을 구원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비록 자주 실패할지라도 문학 하는 자는 ‘예술의 구원’을 믿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화창한 토요일 오후 함께 모여 앉아 삶을 기록하고 나눈 게이들이 새삼 예술의 기원이 아닐 리도 없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어떤 예술이 지금 여기에 존재해야하는 당위에 관해 묻는다면, 거의 정답에 가까운 대답은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누군가가 당신에게 삶이 계속돼야 하는 당위에 관해 묻는다면, 거의 오답에 가까운 대답은 ‘그리고 예술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예술은 계속되는 삶 속에 있고 삶은 계속되는 예술 속에 있기도 한 것이다.
3주간의 짧은 글쓰기 강좌를 마치며 나는 학인들에게 이런 말을 전했다. 여러분의 글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기록이 될 거라고. 그 기록이 결국은 어떤 역사가 되기도 할 거라고. 그 기록이 여러분들보다 오래 살아남아 여러분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도 할 거라고. 응원하는 말이었지만, 자신이 쓰는 글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충고이기도 했다. 누군가를 향한 응원과 충고의 말은 늘 가장 먼저 자신을 향하는 것.
최근 나는 “허나 하느님/형들의 사’랑을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아요”라고 시에 적었다. 시의 제목은 ‘형들의 사랑’이었다. 1897년에 태어난 안토니오 보토는 ‘소년’이라는 시에서 “아니, 우리가 키스하게 놔둬요,/ 이 저녁의 고통 속에서 단지 키스뿐이에요”라고 적었다. 1897년부터 현재까지도 언젠가 남자와 남자가 만나 사랑의 미래를 확보하는 이야기를 꿈꾼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어떤 지난한 삶을, 역사를 증명하는 것일까. 결국 (퀴어)문학은 혹은 예술은 자신의 삶에 관한 것이고 삶의 가능성에 관한 것이며 그 때문에 타인의 삶과 타인의 삶의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가능성에 관한 것이라면 이런 이야기도 포함시켜야 한다.
한여름 광장에서 당당히 겨드랑이 털을 겨루던 여성들과 웃통을 까는 것이 왜 남자의 것이기만 할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가슴을 드러내던 여성들과 다양한 젠더퀴어들이 자신들의 깃발을 세우던 행진과 퀴어 퍼레이드를 응원하기 위해 자신의 창문에 레인보우 깃발을 걸어둔 이들과 거리에서 카페에서 버스에서 퍼레이드를 향해 손을 흔들어주던 이들의 웃는 모습. 그리고 퀴어라는 서사는 계속된다. 모든 존재는 기록할 만하다. 다만, 예술은 그 기록할 만한 것 중에서도 오로지 폭발적인 것을 취할 뿐이다.
앨런 긴즈버그는 시집 <울부짖음 그리고 또 다른 시들>에 월트 휘트먼의 시 일부를 ‘선언처럼’ 배치해둔다. 떼어내라, 문에 걸린 자물쇠를! 떼어내라, 문 자체를 아예 문틀부터!
- 글
- 김현 (시인)
- 에디터
- 김나랑
- 일러스트레이터
- 권철화
추천기사
인기기사
지금 인기 있는 뷰티 기사
PEOPLE NOW
지금, 보그가 주목하는 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