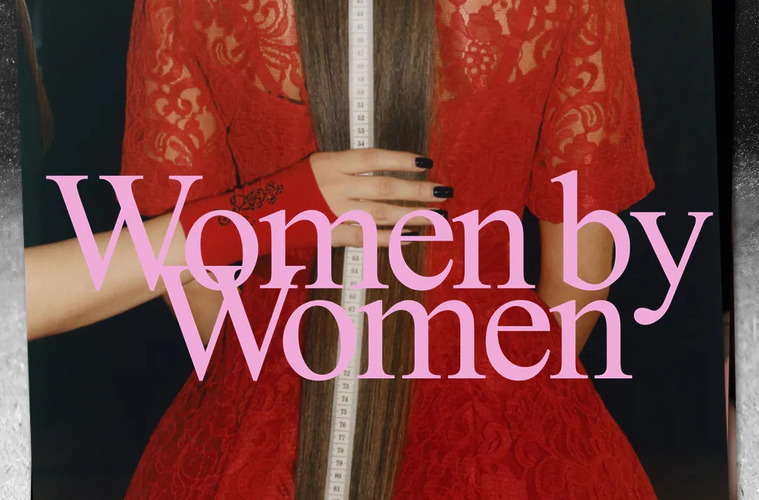흑의의 민족, 한국인에게 고함
몇 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다. 나는 최소한의 짐으로 여행 다니기를 일종의 도전처럼 즐긴다. 이번에도 3주 일정에 바지 두 벌, 티셔츠 다섯 벌, 셔츠 한 벌, 외투 한 벌만 챙겼다. 환절기라서 위아래 15℃ 정도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니 티셔츠가 많아졌다. ‘좋았어, 내 계획은 완벽해!’ 뿌듯한 마음으로 공항에 갔다. 하지만 한국행 비행기 대기실에 들어선 순간부터 후회가 쏟아졌다.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멀리서 보면 유니폼을 입고 단체 여행을 온 고급 미용실 스태프처럼 보였다. 트윈 룩을 입은 신혼부부 한 쌍, 외국인 손님 몇 명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승객이 검정 옷을 입고 있었다. 한국에 살 때는 미처 못 느끼다가 오랜만에 들르면 보이는 우리의 특성이 있는데, 이번에 발견한 한국인의 정체성은 ‘흑의(黑衣)의 민족’이었다. 집에 있는 알록달록한 것들을 몽땅 챙겨 왔어야 했다고 후회해봤자 늦었다. 나는 이미 까마귀 떼의 일원이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내 경우는 최소한의 의복으로 최대의 효율을 추구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다른 여행자들도 마찬가지 계산이었을 수 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해서도 까마귀 떼의 군무는 계속되었다. 한국이 대중문화, 패션, 뷰티를 리드한다는 ‘국뽕’ 콘텐츠를 백만 번은 본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말해서 서울 거리는 아직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성수동이나 이태원에 가도, 실루엣의 다양성에 비해 컬러 활용 범위는 하품이 날 정도로 좁았다.
패션 잡지 편집장이자 그 자신이 컬러풀한 옷을 좋아하고, 워킹맘이기도 한 지인은 이런 복합적인 진단을 내놓았다. “한국 직장의 복장 기준은 아직 보수적이다. 타인의 외모, 스타일, 사생활에 대한 지적이 흔한 문화도 한몫한다. 예컨대 나도 회사에 빨간 스타킹을 신고 갔다가 은근한 지적을 받은 후로 굳이 응답하기 귀찮아서 과감한 스타일은 자제한다. 잡지사까지 이렇다면 일반 회사는 훨씬 더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요인은, 사람들이 컬러를 쓰는 훈련이 안 돼 있다는 점이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알록달록한 것을 꺼리고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어 하는 시기가 있다. 그렇게 패션 암흑기를 보내고 나면 성인이 되었다고 갑자기 감각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나마 실패하지 않는 컬러가 블랙이니까 계속 손이 갈 수밖에 없다.” 보수적인 사회 문화는 한국 패션 잡지들이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한 문제였으나, 성장기 환경과 교육 문제에도 원인이 있다는 진단은 신선했다. 벽지와 바닥부터 전자 제품, 화장품, 칫솔까지 온 집 안을 화이트로 채우는 게 한국 인테리어계의 ‘국룰’이 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으리라.
내가 동남아 휴양지에 살기 때문에 체감하는 문제도 있다. 동아시아인의 피부는 대개 누른 기 도는 중간~밝은 톤이다. 아프리카계나 동남아시아계의 짙은 피부는 비비드한 컬러를 멋지게 강조해준다. 핑크 베이스인 코카시안의 피부도 어울리는 색이 많다. 하지만 동아시아계의 피부는 한때 퍼스널 컬러 진단 열풍이 불었을 정도로 의복 색감을 매치하기가 어렵다. 컬러풀한 옷을 즐긴다는 저 패션 잡지 편집장도 한국인치고 드문 분홍 기 도는 피부다.
환경 요인도 있다. 서울은 중위도 고유의 산란 각도나 대기오염 등으로 하늘을 비롯한 자연의 색감 자체가 강렬하지 않다. 사람들의 감성, 색에 대한 인식, 도시의 무드 전반이 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동남아로 여행 온 한국인들이 한풀이하듯 화려한 패턴과 컬러를 떨쳐입고 다니다가 공항에서 까마귀로 변신하는 걸 보면 이 심증이 굳어진다. 이는 한국인을 위한 색채 연구와 스타일링이 더 정밀하게 이루어기를 바라는 마음, 한국 패션 잡지에 대한 응원으로 이어진다. 쉽게 말해 ‘<보그 코리아>여, 답을 주세요!’ 라는 것이다.
서울의 거리 패션이 거기 사는 사람들의 인식에 비해 훨씬 단조로워 보인다는 건, 캠페인 같은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찌 보면 문젯거리 자체가 아니다. 그저 문화, 패션, 뷰티 강국이라는 터무니없는 착각을 내려놓고, ‘한국 사람들은 옷을 잘 입는다’는 ‘국뽕’ 콘텐츠의 자아도취 같은 것만 배척하면 될 일이다. 그래도 아쉽긴 하다. 거리 의상은 도시의 중요한 볼거리 중 하다. 서울의 그것이 더 다채로워질 수는 없는 걸까? 남 걱정 하기 전에, 나부터 다음 한국 여행 때는 집 안의 온갖 색을 꺼내 올 예정이다. 옷 잘 입는다 소리는 못 들어도 다 큰 단독자가 유니폼을 입고 거리를 활보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 포토그래퍼
- 장기평
추천기사
-

셀러브리티 스타일
배드 버니가 선보인 최고의 패션 모먼트 모아 보기
2026.02.11by 오기쁨
-

라이프
집에서 나쁜 냄새 없애는 가장 기본적인 비법 7
2025.03.10by 주현욱
-

패션 아이템
네모나고 각진 2026년 '잇 아이템', 의사 가방!
2026.02.11by 안건호
-

패션 뉴스
'여성의 시선'에 대하여, 2026 포토보그 페스티벌
2026.02.13by 안건호, PhotoVogue
-

뷰티 트렌드
귀찮을 땐 느슨하게 올리세요, 컬 업
2026.02.04by 김초롱
-

패션 트렌드
우리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 '검정 옷에 청바지' 조합!
2026.02.12by 소피아
인기기사
지금 인기 있는 뷰티 기사
PEOPLE NOW
지금, 보그가 주목하는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