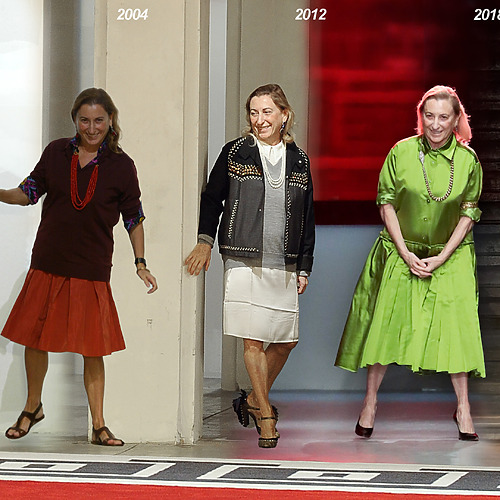애인의 애인에게
“체온이 묻어 있는 것들은 언제나 따뜻했다.” 〈애인의 애인에게〉는 성주라는 한 남자를 사랑한 정인, 마리, 수영 세 여자의 목소리로, 사랑과 관계에 대해 말한다. 성주를 사랑하면서 그를 사랑하는 다른 여자들 또한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이상해 보이는 질문에 대해, 백영옥은 근사한 답을 갖고 있었다.

<스타일> <다이어트의 여왕> <실연당한 사람들을 위한 일곱 시 조찬 모임>의 백영옥이 4년 만에 소설로 돌아왔다. <애인의 애인에게>에서 백영옥은, 사랑이 시간을 멈추어버리는 완벽한 순간에 대해, 나를 잡기 위해 상대가 울부짖었으면 하는 마음을 토해낼 때의 비참함에 대해, 훔치듯 숨어들지 않고는 사랑하는 사람의 일상에 조금도 속할 수 없다는 처연함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에 매달리고 또한 그로부터 도망치는 그 모든 이유에 대해 썼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백영옥은 자기가 쓴 소설을 닮았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을 고르고, 결국 최선을 다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녀는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실패라고 낙인찍지 않는 여유를 갖고 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테이블 위에 여러 개의 초를 켜고 향이 좋은 차를 우린 뒤 반듯한 자세로 앉아 나직하지만 쉼 없이 말하는 목 소리를 들으니,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테이블에 전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졌다.
보그 4년 만의 소설이다.
백영옥 예전에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전부 아닌 것 같아지는 때가 왔다. 사랑, 선택, 미련 같은 단어에 대해 내가 생각하던 정의가 많이 바뀌었다.
보그 경험이 많아지면서 단정 짓기가 힘들어지는 걸까.
백영옥 이쯤 되면 뭔가 알게 되려니 했는데 예상과 달랐다. 살아보지 않은 나이에 대해 예상한다는 것은 참 우스운 짓이었고, 일어날 일은 그냥 일어나는구나 생각했다. ‘그냥’의 세계가 있는 걸 알아버렸는데, 그걸 납득할 만하게 만드는 일이 어렵더라. 내가 하는 말이 다 사기인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책 내면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해야 하잖나. <실연당한 사람들을 위한 일곱시 조찬 모임> 썼을 땐 그렇게 실연당한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웃음)
보그 마치 점쟁이에게 묻듯이.
백영옥 다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경향신문>에서 인터뷰어로 나서는 기획에 참여했다(2014년 <다른 남자>라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서천석, 금태섭, 김영하 등 15명의 남자들과의 인터뷰집이다). 귀 기울여 듣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보다 많이 산 선배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듣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야겠다고. 그런데 소설을 써야겠다 생각하는 시점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한 줄도 못 쓰겠더라. 그러다 발레를 시작했다.
보그 원래 발레를 하고 싶었나.
백영옥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배우면서 보니 발레는 턴 아웃(Turn Out)이라는 걸 정말 많이 한다. 평상시에 쓰는 근육을 전부 틀어서 쓰는 거다.
보그 움직임이 굉장히 편해 보인다.
백영옥 춤추는 걸 좋아했다. 어릴 때 클럽 ‘죽순이’ 같은 거였다.(웃음) 하지만 발레의 기본동작에 맞게 몸을 바꾸느라 8개월간 근육통에 시달렸다. <애인의 애인에게> 쓰면서 좌골신경통으로 고생했는데 발레를 해서 그나마 좋아졌다. 세상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건드리는 것마다 고통스럽다는 느낌이 드니까 오히려 몸이 힘든 게 낫더라. <애인의 애인에게>가 야해진 것은 내가 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인 것 같다. 발레는 몸을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되었다.
보그 남자 주인공인 성주는 정인, 마리, 수영 세 여자뿐 아니라 누구라도 옆에 있으면 한 번은 통과해가는 남자가 될 것 같은 사람이다. 현실에서 친구가 성주 같은 남자를 만나고 있다면 뭐라고 하겠나.
백영옥 만나지 말라고 얘기하지. 당장 헤어져. 여자를 외롭게 말려 죽일 인간이야.(웃음)
보그 그럼에도 애정이 생기더라. 성주가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배경으로 있기 때문에 그의 속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성주를 우상화하지도 경멸하지도 않는 방식으로 매력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백영옥 성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를 통과해가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2012년에 이 책의 일부를 처음 썼다. 정인은 성주를 오래 지켜보다가 그의 집에 몰래 들어간다. 얼마나 무섭나. 그 사람을 복원한다고 생각하고, 발굴하듯이 그 집을 고고학자처럼 연구하는데, 결국 발견하는 건 성주가 아니라 성주 아내다. 정인이 마리의 스웨터를 떠준다는 상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되는 게 옳다고 정인이 주장하더라. 내가 떠주고 싶은 것은 성주의 스웨터가 아니라 마리의 스웨터라고. 소설적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경험이다.
〈애인의 애인에게〉는 세 여성의 상처 공동체다. 내가 위로 받고 싶어서 쓴 소설이라는 생각도 든다. 살면서 정말 힘든 순간엔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옆에 있었다.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것만으로 위로를 주는 건 여자들이었다. 나이 든 여자.
보그 1부의 정인 이야기가 딱 거기까지다.
백영옥 1부는 문장 웹진에 <Hello! Stranger>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는데 소설을 읽은 사람들이 “그 여자는 그 스웨터를 입어요?”라고 묻더라. 그래서 2편을 단편 계간지에 발표했다. 쓰다 보니 이야기가 더 있다고 생각되더라. 원래는 1·2·3·4부가 있었고, 3부에는 시완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시완이 쓴 소설의 여주인공이 2장의 마리다. 3부가 원고지 1,000매가량 됐는데 다 들어냈다. 결국 <애인의 애인에게>는 세 여성 화자들의 상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위로 받고 싶어서 쓴 소설이라는 생각도 든다. 살면서 정말 힘든 순간엔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옆에 있었다.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것만으로 위로를 주는 건 여자들이었다. 나이 든 여자.
보그 남성과 여성이 가진 사회적인 경험의 차이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백영옥 마이너리티로 살았기 때문인 것 같다. 넌 예뻐야 해, 넌 말라야 해, 하는 끊임없는 요구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조율하잖나. 나는 정체성이 타인과의 관계의 총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유로 여자들은 나이 들수록 훌륭해지는 것 같다. 여자들의 노년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를 봤다. 그녀들은 연대하는구나. 지혜와 경험을 저렇게 나눠주는구나.
보그 <애인의 애인에게>를 쓰며 요즘 세상의 연애에 대한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을 것 같다.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하는 말을 할 때, 가장 먼저 연애를 포기한다.
백영옥 너무 자기 계발적인 세계에 살고 있어서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는 들여다보지도 않으려고 한다. 달콤함은 취하고 고통은 가능한 한 피하는. 그런데 달콤함만 취할 수 있으면 사랑이 아니라 데이트만 하는 관계잖나. 연애는 한 인간과의 전면적인 소통이다. 그가 한 권의 책이라고 봤을 때 밑줄을 긋고, 책장도 접어보고, 읽어도 이해 안 되고, 마지막 장부터 읽어보고 절망하고. 그런데 사랑이 자기계발화되는 거다. 정답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보그 SNS상의 자신을 꾸미는 데 더 익숙해져간다.
백영옥 우린 자유롭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안전하고 싶은 거다. 내 생각에 SNS는 과도하게 ‘나’에 집중하게 만든다. 연애도 그래서 포기하는 항목에 들어간다. 고통받지 않겠다는 선언. 내 시간을 뺏기지 않겠다고. 돈이 있으면 나한테 써야지, 너한테 왜. 내가 중요한 시대인 것 같지만 남에게 보이는 내가 중요하다는 상황. 자발적으로 외로워지고 스스로를 단절시킬 수 있는 힘이 너무 없어지는 거 같다. 이런 플랫폼 때문에.
보그 단절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백영옥 그게 돈이 많이 드는 게 문제다. 인터넷이 안 터지는 곳으로 여행을 가면 된다. 그래서 그런 여행이 트렌드고. 오로라를 보러 갈 수 있다는 항공사 프로모션에 ‘좋아요’가 많은 걸 보면서, 아, 요즘은 고독을 사는 것도 정말 비싸구나 생각했다. 고독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전화를 안 받을 수 있어야 갑인데, 전화를 안 받을 수 없잖나. 최근 <타임푸어>라는 책을 읽었다. 그 책에 ‘오염된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다. 우리는 늘, 몇 시에 뭘 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에 시달린다. 결국 24시간 연결되어있다는 우리 생의 조건이 정착되면서 오염되지 않은 퓨어한 시간이 점점 부족해진다. 당연히 연애와 사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시스템 안에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와 그 이후의 많은 일을 보며 느낀 게 있었다. 희망으로 희망을 이야기하는 세대는 아니구나. 절망으로 희망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생각해내야 한다는 고민을 하는 중이다. <애인의 애인에게> 식으로 말하면 어둠 속에서 어둠을 보는 법.
보그 그래서 소설을 읽는지도 모르겠다.
백영옥 우리는 그림자든 슬픔이든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한다. 사람은 일로도 도피하고, 페이스북으로도 도피하고, 술로도 도피하지만 그와 반대로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어둠을 끌어안는 소설적 경험이다. 임사 체험 같은 것이고. 소설이라는 예술의 한 장르가 가진 지혜인 것 같다. 소설적인 진실이라는 게, 하나의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읽는 사람이 열이면 열 다 다를 수 있다. 의미는 작가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읽는 사람이 만든다. 서점에 가서 책을 사는 행위가 손목에 시계를 차고 시계를 보는 일처럼 희귀해지는 건가 싶어지면서 노스탤지어가 생기는 기분이 들 때도 있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시대에 소설을 쓴다는 건 무엇일까. 소설을 읽는다는 건 무엇일까. 내게 글을 쓴다는 것은 밥을 먹게 해주는 일이고, 또한 세상을 알아가는 치열한 방식이기도 하다. 그래서 소설 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지도 모르겠다.
- 글
- 이다혜(북 칼럼니스트)
- 에디터
- 정재혁
- 포토그래퍼
- CHA HYE KYUNG
- 헤어
- 이일중
- 메이크업
- 강석균
추천기사
인기기사
PEOPLE NOW
지금, 보그가 주목하는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