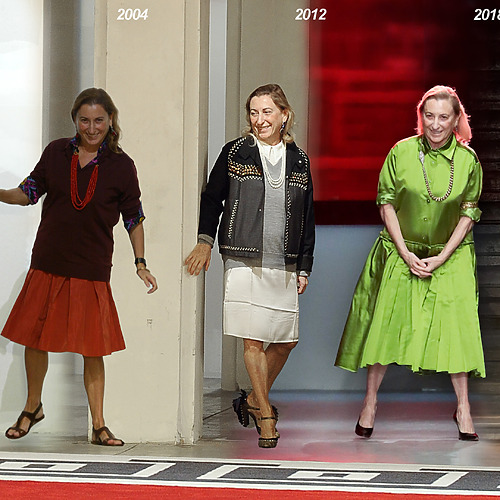취향으로 계급을 나누는 사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영화 <비포 선라이즈>에서 제시(에단 호크)와 셀린(줄리 델피)이 기차간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건 시끄럽게 다투던 독일인 부부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이 읽고 있던 책 때문이었다. 그때 제시가 읽고 있던 책은 배우 클라우스 킨스키의 자서전 <내게 필요한 건 사랑뿐>이었고 셀린이 읽고 있던 책은 조르주 바타이유의 였다. 과장이 아니다. 제시는 분명히 셀린에게 “뭐 읽고 있어요?”라고 물었고 그녀의 책을 보고 웃었다. ‘너 취향 좀 괜찮구나’라는 신호였다. 셀린 역시 “당신은요?”라고 물었고 그가 읽고 있던 책이 한심한 자기계발서나 누구나 다 읽는 파울로 코엘료나 무라카미 하루키 책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아름다운 사랑 영화를 괜히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다. 그 후 제시는 W.H. 오든의 시를 인용하고 레코드점에서 킹크스의 음악을 뒤적거렸고 셀린은 캐스 블룸의 ‘Come Here’를 제시와 함께 듣는다. 만약 그들이 원태연의 시를 인용하고 저스틴 비버의 음악을 함께 듣자고 했어도 그렇게 빨리 사랑에 빠졌을까? 스티브 잡스는 이런 명언을 남겼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유일한 문제점은 그들이 어떤 취향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잡스의 등장은 취향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그는 마치 우리를 복잡한 취향의 세계로 안내하기로 작정한 듯 보였다. 누구라도 언제든(특히 잡지에서) “당신의 아이팟에 있는 곡은?”이라고 물어올지 모르니 우리는 아이팟에 자신만의 음악 리스트를 심사숙고해 만들어나가야 했다. 그리고 지금, 취향은 MP3 플레이어의 공간 너머로 확장됐다. SNS가 이끄는 이 시대는 취향을 드러내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다. 인스타그램은 좋아하는 음반 커버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칫솔까지 얘기하도록 윽박지르고 있다. 인스타그램의 ‘좋아요’는 아주 세밀하고 깊숙한 취향에 대해 당신이 아는지 모르는지, 거기에 동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는 국내에 번역된 적도 없는 미국 작가의 책, 평생 만날 일도 없을 것 같은 우크라이나의 디제이들, 구해 보기도 힘든 1970년대 컬트 영화가 잔뜩 올라와 사람들로 하여금 밤새 구글을 검색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모두가 1등 취향 계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경쟁하는 이미지 전쟁터다. 영국 팝 스타 릴리 알렌도 이렇게 말한 적 있다. “셀피의 시대에 산다는 건 사람들이 자기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걸 뜻한다. 그러니 취향에 대해 압박받는 건 당연하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미 1757년에 영국 철학자 데이비드 흄은 취향의 속성에 대해 “인간의 다양한 감정에 근거한 규칙으로 하나의 감정을 결정하는 결정, 최소한 다른 어떤 것을 비난하는 근거”라고 말한 적 있다. 그리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1979년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의 저서 <구별짓기>를 통해 드러났다. 그는 프랑스 대중을 상대로 문화 소비 형태를 조사했고 계급에 따라 문화 소비도 계층화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우리가 취향이라고 부르는 건 사회적으로 자신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징’이라는 무시무시한 결론을 도출해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엄청 찔리는 얘기이기도하다. 혹시 누군가의 집에 가서 조잡한 취향의 물건을 보고 한숨 쉬며 내다버리고 싶은 적 없었나? 어려운 예술 영화를 보러 가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훑은 적은? 자, 이제 인정하자. 취향은 우리의 문화적 스노비즘을 드러내는 도구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취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더 나쁜 취향을 가지고 있을까? 좋은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문화적 허영심이 더 강한 것일까? 나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취향이 사람들 간의 우위를 결정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순진한 사람들일까? 소설가 알랭 드 보통은 취향이 개인의 특성을 드러내는 징후일지도 모른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삶이 혼돈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미니멀한 것에 끌리고, 조잡하고 과장된 것을 애호하는 취향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문제는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이 취향이라는 것 자체가 점점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거다. 사회학자 리처드 피터슨과 로저 컨은 “최근에는 사람들이 속물이라는 꼬리표를 피하기 위해 문화 소비에 있어 잡식성 동물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피치포크 미디어에서 추천한 희귀 인디 록 음반을 들으면서도 아이돌 음악에 열광하는게 그런 이유다. 촌스러운 취향의 대명사로 취급되던 셀린 디온의 노래가 자비에 돌란의 영화 <마미>에 나온 이후 쿨한 태도의 지표로 쓰이는 게 그런 맥락에서다.
이제 원태연의 시와 저스틴 비버의 음악이 더 매력적인 취향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잠자코 입 다물고 있을 수만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어쩌라는 거냐고? 지금 당신이 으스대는 취향이 내일모레 당신이 비웃는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염두에 두라는 얘기다. 패션 디자이너 재스퍼 콘란의 예리한 지적처럼 “오늘 굉장히 취향 좋다고 생각한 것이 내일이되면 별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글
- 나지언(프리랜스 에디터)
- 에디터
- 윤혜정
- 일러스트레이터
- KIM YE SHIN
추천기사
인기기사
PEOPLE NOW
지금, 보그가 주목하는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