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스트의 책상
영화 비평가라는 타이틀로 글을 쓸 일이 잦지만, 매번 나의 글이 비평의 형태로만 한정되는 건 원치 않는다. 물론 글에서 형태와 형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고 있다. 어쩌면 형태와 형식이 글, 예술, 삶의 전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도 많다. 궁극의 아름다움과 찬란한 순간은 형태와 형식에서 이미 결정 나버리는 게 아닐까 하고 말이다. 바로 그와 같은 이유로, 나는 가능만 하다면, 매번 내 글의 형태와 형식을 다르게 가져가고 싶다. 틀이 중요한 만큼, 틀을 허물고 싶다. 틀을 갖되, 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 틀이 있되, 틀이 없기를 바란다. 그 하나의 가능성을 나는 작가 배수아의 글에서 발견한다.
“나는 소설을 쓰기를 원했으나, 그것이 단지 소설의 형태로만 나타나기를 원하지는 않았다.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가 될 것이다.”

지난번에 배수아의 <작별들 순간들>(문학동네, 2023)을 읽은 이후, 나는 20년을 거슬러 올라가 <에세이스트의 책상>(문학동네, 2003)을 펼쳤다. 오래전부터 작가는 하나의 형태로 수렴되지 않는 글쓰기에 관해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미 쓰인 글은 작가의 손을 떠나버린 것이므로 더더욱 쓰는 그 순간에 몰두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었다.
<에세이스트의 책상>의 내용을 요약해보라고 한다면 사실 좀 난감하다. 플롯이 명확한 글은 아니다. 글에는 ‘나’와 몇몇 인물이 있고, 그들은 언어, 음악, 죽음에 둘러싸여 있고 때로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때때로는 추상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 듯하다. 베를린의 풍경, 그곳 사람들, 그곳 분위기 같은 게 단편적으로 기억난다. 그 가운데 몇 가지 단편적인 인상을 가져와 문장으로 만들어보자면 이렇다. ‘나’는 베를린에 있지만 서울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M에게 강렬한 애정을 느끼면서도 M을 떠나올 것이다. ‘나’는 요아힘과 에리히를 만나지만 그들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나’는 M에게서 언어를 배웠지만 M에게서 음악을 배웠어야 했다. 뭔가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언어와 음악은 공통될지 몰라도 음악만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 유일하게 인간 외부에서 인간을 응시한다. 언어 아닌 음악이었다면, ‘나’와 M은 지금과는 다른 관계였을 것이다. 그리고 최후의 ‘나’는 책상 앞에서 계속 글을 쓴다. ‘단지 글을 쓰고 있을 때만이, 나는 비로소 내가 되며 진실로 집에 있는 듯이 느낀다’고 말한 페터 한트케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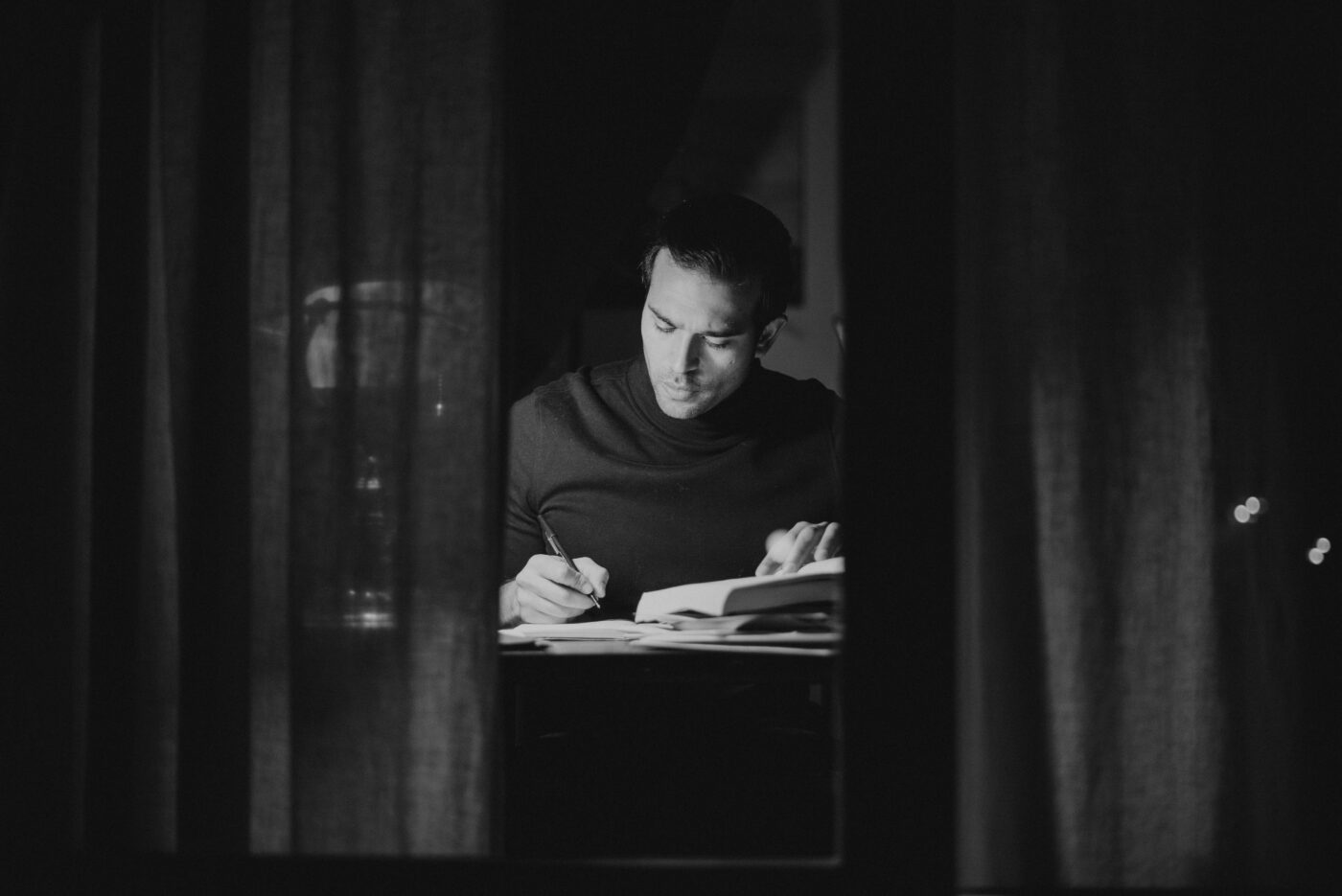
<에세이스트의 책상>의 독자에게 작가가 전해온 말을 덧붙여두는 게 좋겠다. 작가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M의 책을 항상 여러 권 동시에 읽는다. 이때 ‘읽는다’는 건 실제로 읽는 것뿐 아니라 읽지 않는 상태까지도 모두 포함한다. M의 책이 어지럽게 흩어진 장소가 곧 작가의 공간이다. M의 문장을 떠올리면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지 않다. 오직 ‘순간적인 떠오름’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M은 작가와 언제나 함께했고, 매 순간 속에 생생히 살아 있는 듯하다. 그런 M이 죽었다. 작가는 M의 부고를 들었다.
<에세이스트의 책상>의 M은 작가 M일까, M이 아닐까. 책 속 M과 작가 M은 얼마나 가깝고 닮았을까, 아니면 전혀 다를까. 진정한 M은 누구인가. M은 진정 어디에 있는가. 더 노골적인 질문. <에세이스트의 책상>은 소설인가, 에세이인가. 이 둘은 다른가. 배수아의 세계에서 그것은 다를 수 있을까. 연이은 질문의 대답을 다시 <작별들 순간들> 속에서 발견한다.
‘나’는 누구인가. 어떤 상태인가. “…나는 오래전부터 M⁕⁕⁕의 속삭임으로 이루어지는 소설을 쓰고 있는데, 스스로 그 목소리의 미디엄이 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기 때문이라고.”(p.133)
그렇다. ‘나’ 혹은 작가는 <에세이스트의 책상>의 M 혹은 <작별들 순간들>의 M⁕⁕⁕ 혹은 세상을 떠난 작가 M의 목소리 미디엄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지 않은가. 형태와 형식에 관한 명확한 경계 지음 없이. 미디엄이라면! 존재와 순간, 그 사이사이를 넘나들 수 있다. 미디엄이라면! 흐르고, 이어나갈 수 있다. 미디엄, 미디엄이라면! 바라건대, 나 역시 그런 글을 쓰기를. 그런 글의 형태와 형식과 만나기를.
- 포토
- 문학동네 홈페이지, Pexels
추천기사
인기기사
지금 인기 있는 뷰티 기사
PEOPLE NOW
지금, 보그가 주목하는 인물

























